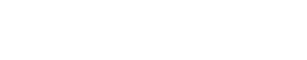[NT:뷰] ‘타지마할의 근위병’ 침묵과 호흡으로 빚어진 세계
- 전시/공연 / 권수빈 기자 / 2025-11-20 10:47:24
 |
| ▲사진=연극 ‘타지마할의 근위병’ |
[뉴스타임스 = 권수빈 기자] 8년 만의 귀환으로 다시 관객 앞에 선 연극 ‘타지마할의 근위병’은 미학적 절제와 윤리적 질문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이다. 타지마할이라는 세계적 아름다움의 배경을 차용하면서서 건축물의 장엄함을 재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의적으로 ‘비어 있는 무대’를 선택함으로써 아름다움의 제작 과정과 이면의 억압과 침묵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
이번 재연은 미니멀리즘을 더욱 강화해 타지마할이라는 상징적 구조물의 화려함을 철저히 제거한다. 관객은 거대한 제국의 권력과 압도적 미학을 직접 보지 못한 채 그것을 지키는 두 근위병의 담담한 언어를 들으며 상상만으로 공간을 구축한다. 이것은 연출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공백이며, 빈자리에 권력의 폭력성과 복종의 윤리가 자연스레 배어 나온다. 관객은 아름다움 자체보다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인간이 어떤 위치에 놓이는가에 집중하게 된다.
1648년 새벽, 휴마윤과 바불의 대화 속에는 극적 사건이 거의 없는 듯 보이지만 대본은 치밀하게 계산돼 있다. 권력과 윤리, 명령과 양심, 신념과 삶의 욕망이 서로를 밀어내며 얽히는 구조 속에서 체제와 개인의 사상이 충돌한다. 라지브 조셉의 언어는 상징적이며 종종 시적이지만 상징은 현실의 폭력을 에둘러 말하는 장식이 아니라 폭력의 윤곽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도구로 작동한다.
신유청 연출은 두 인물의 대화를 일정한 리듬감으로 조율한다. 휴마윤의 단정하고 규율 중심적인 언어는 직선적인 리듬으로, 바불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은 곡선적인 리듬으로 구성되어 서로 충돌한다. 장면 사이사이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침묵은 관객이 감정과 사건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재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배우의 존재감이 무대의 질감을 결정짓는 지점에까지 다다랐다는 점이다. 휴마윤 역의 최재림과 백석광, 바불 역의 이승주와 박은석은 각기 다른 해석으로 장면의 중심을 이동시키며, 같은 대본이 서로 다른 정치적 함의를 생산하도록 이끈다.
조명 또한 이번 공연에서 중요한 감정 장치로 작동한다. 새벽빛이 서서히 변해가는 조명 설계는 두 인물의 대화가 가진 시간이 얼마나 정교하게 흐르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타지마할을 상정하는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은 인물의 몸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권력과 아름다움의 무게를 은유한다. 반면 성벽 안쪽에서 떨어지는 빛은 인물의 고독과 사유를 강조한다. 조명의 이중 구조는 공연의 주제 해석과 맞물려 관객에게 두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공간감을 제공한다.
 |
| ▲사진=연극 ‘타지마할의 근위병’ |
작품이 관객을 사로잡는 지점은 근본적인 질문을 명확히 한다는 데 있다. 타지마할은 세계적 아름다움의 상징이지만 조셉은 “아름다움은 어떤 희생을 통해 세워지는가”, “그 희생은 누구의 몫인가”라는 질문을 두 병사의 언어로 밀어붙인다.
이 작품이 2025년 다시 강한 현재성을 띠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미학적 가치를 위해 윤리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미술관·건축·국가 브랜드의 미학적 장치 뒤에서 누군가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누군가는 복종을 의무로 배운다. 작품은 그러한 상황을 고요한 새벽이라는 배경 안에 압축해 놓는다.
프리뷰로 작품을 관람한 관객들은 “두 배우의 호흡만으로 공간이 완성된다”, “절제된 미학이 극의 윤리를 강조한다”는 반응을 남겼다.
‘타지마할의 근위병’은 재연을 통해 연극이 어디까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지, 배우의 언어가 얼마나 큰 긴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미학적 절제가 어떻게 윤리적 질문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지 증명한다. 공연이 끝난 후 남는 것은 거대한 타지마할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던 두 사람의 숨소리와 그들이 나누던 질문들이다.
뉴스타임스 / 권수빈 기자 ppbn0101@newstimes.press
[ⓒ 아시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