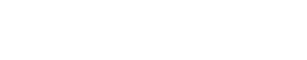폐기물에서 자원으로…순환의 새로운 문법
- 환경 / 우도헌 기자 / 2025-11-14 14:50:30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을 통째로 재편하는 전환점이다. 그 변화의 가장 전면에 선 것이 바로 자원회수시설, 즉 현대적 소각·선별·유기물 처리 시스템을 통합한 폐기물 종합관리 인프라다. 여수시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받으며 사업 추진 속도를 크게 높인 것은 정책적 필연성과 지역적 현실이 겹친 결과라 할 수 있다.
 |
| ▲사진=연합뉴스 |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이라는 역할만 수행하지 않는다. 여수시 계획을 보면 350t/일 생활폐기물 소각, 150t/일 음식물 자원화, 30t/일 재활용 선별이 한 시설 안에서 모두 이뤄진다. 이러한 구조는 폐기물이 ‘소각·매립’이라는 종착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에너지 회수, 바이오가스 생산, 재활용 자원 재선별 등으로 다시 순환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명칭 그대로 ‘폐기물 처분’이 아닌 ‘자원 회수’다.
한국의 매립지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중소 도시들도 더 이상 자연이 해결해주던 시대에 머물 수 없다. 특히 2030 직매립 금지 조치가 본격화되면 단순 매립에 의존하던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 대란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앞다투어 자원회수시설 신규·증설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 반대, 환경 우려, 갈등 조정 실패로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여수가 산단 인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확정한 것도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자원회수시설 정비는 환경정책을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다. 직매립은 메탄을 대량 배출한다. 소각·자원화 중심 체계는 온실가스를 감축해 이 문제를 크게 줄인다. 현대식 소각장은 회수 에너지를 지역 난방·산업용 열로 재공급할 수 있으며 바이오가스, 퇴비 등 2차 자원 생산으로 비용 구조가 개선된다. 처리 효율이 높아지면 불가피한 잔재물만 매립해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우리 사회가 ‘쓰레기 문제를 어디에 두고 해결할 것인가’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폐기물 처리는 소수 지역이 떠안을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도시가 자립해야 하는 시스템적 과제가 된 지 오래 되었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 아시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