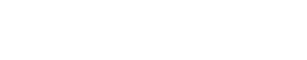치료제 없는 SFTS, 병상을 넘어 의료기관 내 전파 위협
- 사건/사고 / 우도헌 기자 / 2025-07-01 09:49:02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청주의 한 병원에서 진드기가 매개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의료진 사이에서 2차 감염으로 집단 발생했다.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 7명이 심폐소생술 등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노출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다행히 현재는 모두 증상이 사라졌다.
한국에서 SFTS의 역사는 비교적 최근이다. 첫 보고는 2013년에 있었고, 이후 점차 환자 수가 늘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사에서는 172명이 감염됐고, 당시 치명률은 약 32.6%에 달했다. 이후 인식이 높아지고 진단 역량이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더 많은 환자가 발견되고, 비교적 경미한 경우도 포함되기 시작했다. 2016~2021년 데이터를 보면 치명률은 평균 약 16.8%**로 낮아진 것으로 보고됐다.
SFTS의 전염성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는 진드기 매개 질환이지만 중증 환자나 사망자와의 직접 접촉, 특히 혈액이나 체액 노출을 통해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노출된 의료진, 장례지도사 등이 2차 감염된 사례들이 보고돼 왔다.
이런 특성 때문에 SFTS는 치명적이다. 고령층이나 면역이 약한 환자일수록 사망 위험이 높고, 여러 장기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백신도 없고, 확실한 치료제도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로선 증상을 완화하는 지지치료(supportive care)가 중심이고, 특별히 승인된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다. 과거 임상 연구에서 파비피라비르나 회복기 혈장 치료 등이 일부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지만 효능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예방이 최선의 전략이다. 의료현장에서는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다. 얼굴 보호구, 가운, 장갑 등을 철저히 갖추고, 환자의 체액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절차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 당국도 이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의료종사자들이 환자를 돌볼 때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의료현장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위협을 다시 일깨운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진드기에 물려야 걸리는 병’이라는 공식이 의료 접촉을 통해 깨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진드기에 주의해야 하고, 의료진은 자신의 방어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경계하고 준비하는 태도만이 비극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SFTS는 작은소피참진드기와 같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이다. 감염된 후에는 5일에서 길게는 14일 사이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며, 혈소판 감소와 백혈구 감소 같은 혈액학적 이상도 동반된다. 일부 환자에서는 다발성 장기부전, 출혈, 신경계 증상 등 심각한 병증이 진행되기도 한다.
 |
| ▲사진=연합뉴스 |
한국에서 SFTS의 역사는 비교적 최근이다. 첫 보고는 2013년에 있었고, 이후 점차 환자 수가 늘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사에서는 172명이 감염됐고, 당시 치명률은 약 32.6%에 달했다. 이후 인식이 높아지고 진단 역량이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더 많은 환자가 발견되고, 비교적 경미한 경우도 포함되기 시작했다. 2016~2021년 데이터를 보면 치명률은 평균 약 16.8%**로 낮아진 것으로 보고됐다.
SFTS의 전염성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는 진드기 매개 질환이지만 중증 환자나 사망자와의 직접 접촉, 특히 혈액이나 체액 노출을 통해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노출된 의료진, 장례지도사 등이 2차 감염된 사례들이 보고돼 왔다.
이런 특성 때문에 SFTS는 치명적이다. 고령층이나 면역이 약한 환자일수록 사망 위험이 높고, 여러 장기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백신도 없고, 확실한 치료제도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로선 증상을 완화하는 지지치료(supportive care)가 중심이고, 특별히 승인된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다. 과거 임상 연구에서 파비피라비르나 회복기 혈장 치료 등이 일부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지만 효능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예방이 최선의 전략이다. 의료현장에서는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다. 얼굴 보호구, 가운, 장갑 등을 철저히 갖추고, 환자의 체액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절차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 당국도 이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의료종사자들이 환자를 돌볼 때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의료현장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위협을 다시 일깨운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진드기에 물려야 걸리는 병’이라는 공식이 의료 접촉을 통해 깨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진드기에 주의해야 하고, 의료진은 자신의 방어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경계하고 준비하는 태도만이 비극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 아시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