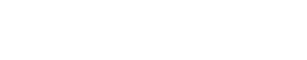[NT ZOON:IN] 고영우 특별전, 어둠 속에서 빛을 그리다
- 전시/공연 / 권수빈 기자 / 2025-04-08 09:46:04
 |
| ▲사진=누보 |
[뉴스타임스 = 권수빈 기자] 1978년작 ‘무제’ 한 점만으로도 우리는 고영우라는 이름을 잊기 어렵다. 제주 서귀포 출신의 화가 고영우(1942년생, 83세)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인간의 어두움과 내면의 울림을 탐색해 왔다.
고영우는 1942년 제주 서귀포 솔동산 일대에서 태어났다. 부친 고(故) 고성진 화가는 일본 태평양미술학교를 졸업한 제주 1세대 서양화가이자 시인이었다. 부친의 영향 아래 그는 일찍이 예술의 감수성과 사유의 깊이를 익혔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했으나 공황장애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인 3학년 때 공황장애 증세로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 서귀포로 돌아왔다. 그는 반세기 넘게 반경 3~5km의 고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좁은 공간 안에서 자신의 내면과 싸우며 그림을 그렸다.
그에게 그림은 탈출구이자 생존의 방식이었다. “불안을 물리치기 위해 하룻밤에 여덟 점을 그린 적도 있다”는 고백처럼 그의 작업은 고통과 예술이 맞닿은 자리에서 피어났다. 고영우는 “나의 작품의 본질은 나의 약함”이라고 단언한다. 고립과 불안, 모호함, 상실 같은 감정은 그에게 있어 결함이 아니라 예술의 근원이 된 것이다.
고영우의 작품 세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1970~1990년대 물감이 귀하던 시절, 그는 크레파스를 사용해 실험적 기법을 펼쳤다. 덧칠하고, 지우고, 긁고, 문지르며 화면 위에 감정의 층위를 쌓았다. 작품 속에는 드러나지 않은 인물들이 숨겨져 있으며, 엑스레이로 비춰야만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반복적 ‘덮음과 지움’의 행위는 훗날 그의 철학이 된다. 대표작 ‘너의 어두움’(크레파스)은 인간 내면의 복잡한 정서를 색채와 질감으로 표현한 시기의 결정체다.
2000년대 이후에는 모노톤의 군상 시리즈를 선보인다. ’너의 어두움’(유화)은 획일화된 현대인의 초상을 그린다. 직립한 인물들이 서로를 외면한 채 서 있는 장면은 고립된 인간의 초상을 압축한다. 색은 절제되고, 형태는 단순해졌지만 화면의 정적은 오히려 강렬하다.
최근에는 커피를 재료로 사용한 드로잉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커피의 농담(濃淡)을 이용해 인간의 영혼과 그늘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고영우는 ‘종지기 화가’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서귀포의 한 성당에서 45년째 매일 오후 6시, 직접 종을 울려왔다. 그는 이를 “병약한 삶을 지탱하는 힘이자 생명에 대한 감사의 의식”이라고 말한다. 종소리는 그에게 있어 신앙의 행위이자 그림과 맞닿은 행위다. 이처럼 신앙, 고독, 예술은 그의 삶 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세 축으로 존재한다.
그의 45년 예술 여정을 아우르는 기획전 ‘Layers of Fantasy ― 환상에 대한 환상’는 오는 5월 31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 갤러리 누보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1980~1990년대 크레파스 작품, 드로잉, 2000년대 이후의 모노톤 유화 군상 등 50여 점을 망라한다.
소장자들의 참여로 성사된 ‘공동의 기억 전시’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송정희 갤러리 누보 대표는 “작가를 존경하는 다수의 개인 소장자들이 자발적으로 작품을 내주었고, 소장 연유를 기록하는 아카이빙 작업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시 기간 동안 소장자와의 대화 프로그램, 전시 해설 등도 마련돼 관람객과의 소통이 기대된다.
 |
| ▲사진=누보 |
고영우가 평생 천착해온 주제는 ‘어두움’이다. 그에게 회화란 빛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의 어둠은 절망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통찰하기 위한 통로다. “슬픔은 인간이 지닌 원초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감정이다. 나는 인간의 어두움에서 선한 것을 본다”는 말처럼 어둠 끝에서 선함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고영우는 제주 지역을 넘어 한국 현대미술에서 보기 드문 내면 탐구형 작가로 평가받는다. 외부의 화려한 세계보다 인간의 심연을 그린 그의 태도는 오늘날 빠르게 소비되는 예술계에서 더욱 독보적이다. 예술의 진정성과 정신적 깊이를 지닌 작가로 존경받고 있고, 후배 작가들에게는 ‘자신의 세계를 지키는 법’을 일깨워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고영우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깊은 동굴 속을 걷는 기분이 든다. 어둠은 두렵지만 그 안에는 분명 따뜻한 온기가 있다. 그의 예술은 ‘약함을 버리지 않은 강함’으로 우리 시대의 위로가 된다.
뉴스타임스 / 권수빈 기자 ppbn0101@newstimes.press
[ⓒ 아시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